영어에 울고 교육에 웃는 자영업자 코리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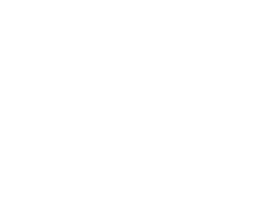 323
323
현지르포·캐나다의 한국인·한국인 사회
기사입력 | 2005.04.21 14:45
- 영어도 제대로 못 하는 한국인들이 대거 캐나다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 캐나다가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토에 인구는 3000만 정도다. 97년 1인당 국민소득은 미화 1만9670달러로 세계 14위, G7 회원국인데다 공무원들의 청렴도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간 개발지수 또한 94년부터 2000년까지 7년 연속 1위다. 그렇다 해도 캐나다가 ‘아무나 이민 오면 살기 좋은 나라’는 결코 아니다.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을 극복해야만 한다.
영어를 거의 못 하는 교민 최모씨(44세, 토론토 거주)의 자동차가 1998년 어느 날 고장이 났다. 냉각수가 과열돼 일어난 고장이었다. 그는 몇 달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차를 딜러의 직영 정비공장에 맡기고 수리기간에는 그 딜러의 부담으로 다른 차를 렌트해 탄 적이 있었다. 최씨는 이번에도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정비공장을 찾아갔으나 담당직원은 차는 고쳐주겠으나 렌트비는 부담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본격적으로 따지고 들어야 할 상황이었지만 영어실력이 문제였다. ‘같은 고장이 보증수리기간에 일어났는데 왜 서비스 내용이 다른가? 두 번이나 같은 고장이 났으니 이번에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항의를 최씨는 손짓 발짓을 포함해 온갖 지혜를 다 짜내 제기했으나 직원은 끝내 거절이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삭이며 그는 인근 렌터카 업소로 발길을 돌렸다. 대중교통수단이 빈번히 운행되지 않는 이곳에서는 당장 집에 돌아가려면 자기 부담으로라도 차를 빌릴 수밖에 없다. 렌터카 직원이 차를 내주려고 준비하는 동안 최씨가 동행한 딸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뜻밖에도 그 직원이 한국인이냐고 물어왔다. 그 직원은 초등학교 때 이민 온 한국인 1.5세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녀가 즉각 유창하고 매서운 말투로 정비공장에 항의 전화를 대신 걸어 렌트비의 절반을 딜러가 부담하게 했다.
처음 수리를 맡겼을 때 정비공장의 담당직원은 중국계였고, 두 번째 수리 때는 백인이었다. 최씨는 만약 자신이 백인이었거나 영어가 유창했더라면 그 직원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인종과 관련한 최씨의 예단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나 영어 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캐나다 드림을 좇아 한국인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다. 앞의 최씨처럼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뿌리를 박고 살 결심을 하는 이들이 왜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무엇보다 캐나다가 살 만한 나라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998만㎢)에, 약 3000만(1996년 센서스 당시 2853만)의 인구가 산다. 1인당 국민소득(GNP)이 1997년 미화 1만9670달러(자료: 세계은행)로 세계 14위였고 선진 7개국의 협의기구인 G7 회원국이다.
캐나다의 공무원들은 청렴한 편이다. 1998년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연례 국가별 투명도 조사에서 조사대상 85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각국 관리들의 청렴성에 대한 국제기업인들의 견해를 지수화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다.
유엔이 해마다 발표하는 각국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캐나다를 94년부터 2000년까지 7년 연속 1위로 평가했다. 이 지수는 각국의 평균수명, 문맹률, 국민소득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7년 동안 순위에 변동이 없으니 이 나라의 뉴스미디어들은 근년 들어 유엔이 새로 지수를 발표해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유엔인간개발지수 7년 연속 1위
이쯤의 데이터만으로 캐나다가 공기 맑고, 물 깨끗하며, 경관이 수려하고, 인정이 덜 각박한 나라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캐나다는 분명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나 이민 가도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아니다. 적어도 다음에 드는, 교민사회 실상 몇 가지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민을 결행해야 할 듯하다.
한국인 이민자가 가장 먼저 느끼는 불편은 언어장벽이다. 이민 온 지 10년이 넘은 사람 중에서도 이 나라 말(주로 영어, 일부 지역에서는 프랑스어)을 거의 못 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영어로 물건 사기, 길 묻기 등 생활에 필수적인 대화를 하거나 자기 비즈니스 분야에서 의사소통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교민은 교민사회에서 ‘영어 잘 하는 사람’ 축에 든다.
그러나 인생과 사랑, 종교와 예술, 대중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음모나 배반에 관한 얘기를 이 나라 말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한 언어장벽으로부터 해방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솔직히 이민 1세로 교민사회에서 영어를 잘 하는 편에 드는 사람조차 주류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종차별 탓도 없지 않겠으나 더 큰 원인은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교감할 만큼 영어실력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토론토나 밴쿠버처럼 한국교민이 많은 캐나다 도시에는 한국인이 한국어로 생활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가 많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변호사 등의 영역에서부터 이·미용실, 한국식품점, 가전제품전문점, 표구점 등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업소가 한국어로 서비스한다. 이렇다 보니 교민 수가 수십만명씩 되는 미국의 대도시뿐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한국인이 영어 한 마디 못 하고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그럭저럭 버틴다’는 말의 이면에는 큰 고통이 감춰져 있다. 자녀의 진학상담을 위해 교사를 만나야 할 때, 한국인 아닌 전문의를 만나야 할 때, 잘못된 전기료 고지서가 날아들었을 때…. 싫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수많은 장벽 앞에서 영어가 달리는 사람들은 심한 좌절을 느낀다. 상업적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돈도 돈이거니와 ‘내 수족처럼 나를 위해’ 봉사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고, 영어 잘 하는 교민에게 부탁하기도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듣기와 말하기뿐만 아니라 독해력의 부족도 장애가 된다. 우편함에 날마다 배달되는 많은 양의 우편물을 선별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주류사회가 발행하는 신문은 읽을 엄두도 못 내는 교민이 숱하다.
영어를 못하면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생업 선택에 제약을 받는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영어권 사회와 접촉을 기피하게 되면서 지적인 소외감과 무력감, 쉽게 말해 바보가 된 느낌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해야 하는 영어를 잘 못해, 혹은 잘못 알아들어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 긴장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 나라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기 어려워 교민사회 내에 움츠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캐나다에 일단 입국한 뒤에 영어 실력을 보충할 수 있고, 정부가 그런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싼 값에 많이 제공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영어에 능숙해진 사람도 많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